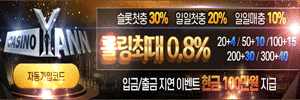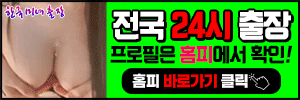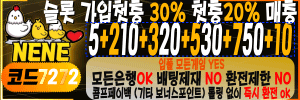내 나이 쉰넷에 1 - 8부
8
온 몸에 알이 밴 듯 쏙쏙 쑤시고, 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사나흘 생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연 이틀 그렇게 격열하게 씹을 해댔으니,,,,,,,
순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애들 기르는 가정주부가 맨날 밖으로 나돌 수도 없고,,,,,
겨우 두 번 보고 씹 한번 한 사이인데도, 이상하게도 자꾸 얼굴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지들은 자기를 강간한 남자한테 정든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거 한번 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눈 앞에서 얼굴이 어른거리는 데,,,,,,
이러면 안 된다고, 참고, 또 참아 봤지만, 일주가 지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순철씨와 나의 만남은 계속되게 되었어요.
신혼 때의 신랑 신부들이 그런 기분이었을 거 같아요.
우리 랑과 나 사이에는 사실 신혼 시절이란 게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 본격적인 연애(그 전에도 잘 아는 사이)기간만 해도 무려 4년이나 있었고,
결혼 후 두 달 만에 출산, 그리고 남편의 취직으로 인해 일년간 별거 등, 신혼 기분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순철씨를 만나고 나니,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있죠?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은 열이 오르고, 항상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게 아마 이런 걸 보고 사랑의 열병이라고 하는 걸 거에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랑이 내가 순철씨 하고 씹하고 온 날은 기막히게도 아는 거에요.
말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꼭 그 날만 씹을 하자고 하네요.
아니 내가 순철씨를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그날만 덤벼드는지?
나이도 한창 때고 둘이 모텔에 가면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격열하게 하자나요.
횟수도 두,세 번은 하게 되고 몸이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보지두덩도 좀 붓고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해도 좆물도 좀 남아 있고,
그런데 랑은 내 얼굴만 보면 아나 봐요.
순철씨하고 씹하고 온 날은 평소보다도 많이 흥분하여 대드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다른 사내하고 하루 종일 씹질을 해대고 와서는 막상 주인이 벌리라는데 안 벌릴 수는 없자나요.
보지는 쓰라리도록 아프고 다음 날이면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음날이면 전화통 앞에 앉아 이제나저제나 순철씨 전화나 기다리고 앉았으니,,,,,,
큰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막내는 이제 겨우 일학년인데, 엄마 손이 항상 필요한 시절이었는데,
엄마란 게 외간 남자한테 미쳐서 나돌아 다녔으니,,,,,,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확실히 미쳤던 거 같아요.
그렇게,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솔솔 부는 9월 중순 어느 날,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랑이 인터폰을 누르네요.
“빨리 나와 봐”
“왜 그러는데?”
“그냥 나와 봐”
우리 집 대문 앞에 번쩍거리는 쏘나타가 서 있는 거에요.
랑이 회사 일로 차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자가용을 산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있는 골목이 삼,사십여 호 되는데 자가용은 다섯 대도 안됐거든요.
더구나 번쩍거리는 쏘나타라니,,,,,,
“그 동안 제대로 쉬어 보지도 못하고, 여름 휴가도 못 갔는데,
우리 10월 초에 연휴도 있으니 고향에나 다녀오자”
나는 마음이 들떠서 열흘도 더 남았건만, 그 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빈 손으로 고향 떠나, 12년 만에 번쩍거리는 자가용 타고 고향 가는데
마음이 안 들떴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9월말일 토요일이었어요.
구월동에 살고 있던 언니네 오라고 해서 아이들 부탁하고,,,,,
영동고속도로에 접어들었는데, 당시의 영동고속도로는 2차선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부지런히 간다고 했는데, 정선읍내에 도착하니, 벌써 날이 어둑하네요.
읍내에서도 비포장도로로 한 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데,
날도 어둡고, 배도 고프니, 읍내서 자고 고향에는 아침에 들어 가 자네요.
하기는 고향에 가 봐야, 시6촌 내외가 살고 있을 뿐,
친정은 내가, 11살 때 읍내로 이사했다가, 내가 시집오던 해에 춘천으로 이사했어요.
시댁은 내가 결혼하던 해에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영월에서 고추농사 짓는 큰 딸네 집에 가 계셨거든요.
반주 한 잔 곁들여 저녁 먹고 여관방 잡아 들어가니 벌써 9시,
랑이 맥주나 한잔씩 더 하자네요.
아,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길 하려나?
둘이 술 마시자고 하면 할 얘기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요.
내가 워낙 지은 죄가 많은 지라, 랑 눈치나 볼 수 밖에요.
둘이 같이 샤워하고, 벌거벗은 채로 맥주 한잔하니 뱃속까지 시원해 지는 게 좋기는 한데,,
랑이 무슨 말을 할지 뻔한데 가슴은 콩당거리고,,,,,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토라지지 말고,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으니, 그런 거자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구.”
이런 땐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좀 유리하자요.
토라진 표정으로 먼저 선수를 쳤더니,,,
“그게 아니고, 다 좋은데 요즘 당신은 너무 들떠있어, 지금 당신은 애들 엄마고, 내 아내라는 사실까지 잊고 있는 게 문제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자나. 우선 나와 당신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변함 없이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바람 피는 사람은 남들보다 두 배 부지런해야 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야 내가 다 이해한다지만, 그 사람의 와이프도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 자나.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하고 그러고 다니면 언제 돈 벌어 가족 부양하고.”
“우리사회가 아직은 바람 피는 여자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아.
언제 동네에 소문 날지 모르는데 항상 조심하고 좀 자제해! 두 번 만날 거 한번으로 줄인다하고,,,,,”
“미안 앞으로는 당신 말 잘 들을께”
맞아요.
어떻게 이룬 가정인데,,,,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단란한 내 가정을 깰 수는 없자 나요.
그렇다고 순철씨를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순철씨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도 쑥골에 도착해 보니, 벌써 9시가 넘었네요.
길이 워낙 험해서 한 시간 예정으로 출발했는데 두 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구경에 빠지기도 했고,
랑이 새 차로 비포장길을 가게 되니 많이 조심을 했나 봐요.
6촌 형님 댁 마당에 차를 세우고 보니, 형님 내외분은 산 비탈 밭일을 하시더라고요.
랑이 큰 소리로
“형님! 나 덕수 왔어요!”
허둥지둥 달려 내려 와 흙 묻은 손으로 우리 두 손을 꼭 잡으시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리네요.]
울 남편 두메 산골에서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향 떠나 아르바이트하며 대학까지 마치고,
스물넷에 고향에서 결혼식 올리고는 바로 취직한다고
고향 떠난지 12년만에 서른여섯 중년에 자가용 몰고 고향 찾았는데,,,,
넷이 서로 얼싸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형님 내외분은 닭이라도 한 마리 잡는다고 부산을 떨고, 우리는 동네나 한 바퀴 둘러보겠다고 나섰어요.
전에 살던 옛집 찾아가니, 다 쓸어지고, 형체만 남았는데 마당에는 잡초가 허벅지까지 차 오르더군요.
우리 랑이랑 나랑 어려서부터 여기서 같이 자랐어요.
집도 담을 같이 대고 붙어 있는 이웃이었지요.
마당 앞에는 장정 여나믄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큰 너럭바위가 있고,
그 앞으로 폭이 2,3미터쯤 되는 개울이 흐르는데, 집은 다 무너졌어도,
너럭바위와 흐르는 개울물은 여전하더라고요.
나와 랑의 모든 추억이 바로 이 너럭바위와 개울에서 시작된 것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우리는 10여리 밖에 있는 분교에 다녔는데, 쑥골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늘 둘이 같이 다녔어요.
학교에 다녀 와서도 같이 놀 또래라고는 둘 밖에 더 있었겠어요.
형제들은 두 집 다 많은 편이었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돈 벌러 나간다고, 도회지로 가고,
우리 오빠도 중학생이 되어 정선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되어,
같이 놀 또래라고는 달랑 둘이 전부였거든요.
냇가에서 고기도 같이 잡고, 여름이면 너럭바위에 둘러앉은 동네 어른들 틈에 끼어 옛날얘기도 듣고,
도깨비 얘기라도 듣는 날은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던 기억까지,,,,
그냥 같이 그렇게 뛰놀며,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우리 랑과 나는 결혼까지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내가 11살 때, 그러니까 랑이 육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요.
동네 사는 언니가 정선읍내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어른들은 모두 읍내에 나가고 동네에는 달랑 우리 둘이 남게 되었죠.
랑네 집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이 형편이 좋아서, 방도 좀 깨끗했고 따듯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우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시골집이라 방바닥은 뜨거운데도 머리 쪽은 찬바람이 휘휘 거리는 거에요.
둘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놀다 잠이 들었었나 봐요.
기분이 이상해서 깨 보니 랑(지금부터는 오빠라고 쓸게요)이
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이제 밤톨만큼 부풀은 내 젖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거에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응 그냥 좀 있어 봐”
난 정말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뭔가 잘 못하는 거 같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얼굴에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쿵당 거리고, 아무튼 싫지는 않았어요.
살짝 눈을 뜨고 오빠를 보니, 오빠도 얼굴이 벌개져 있더군요.
오빠가 내 바지를 끌어 내리고, 내 보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손 끝으로 살짝 살짝 만져주더군요.
찔끔찔끔 오줌을 지리는 것 같은데, 오줌을 싸는 것은 아니고, 온 몸이 짜릿짜릿해 지는데,,
나는 그냥 숨만 쌔근거릴 수 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네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오빠가 더 참을 수가 없었던지 바지를 훌떡 벗고 자지를 꺼내 놓고 나보러 만져 달래요..
개울에서 같이 고기도 잡고 멱도 감고 할 때, 오빠 자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에 보던 거 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빳빳하게 섰는데 색깔도 더 붉어 진 거 같고, 하도 이상해서 “오빠 왜 그래?” 하면서 손으로 잡아 봤어요.
오빠의 얼굴 표정이 확 변하면서,
“응, 그래 ,그렇게, 좀 더 좀 더,”
오빠가 시키는 대로, 몇 번 더 만졌더니, 내 얼굴 쪽으로 오줌을 확 싸 버리는 거에요.
“에이, 오빠 나한테 오줌 싸면 어떻게 해,”
얼른 닦아 내려고 하는데 끈적끈적하는 게, 색갈도 틀리고 냄새도 좀 나고, 이상하더라고요.
오빠가 얼른 부엌에 가서 행주를 가져다 내 얼굴과 손에 묻은 걸 깨끗이 닦아주데요.
“순아야!, 너 오늘 있었던 일 어른들에게 말하면 안돼!”
“응, 알았어”
사실 나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결코 어른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 가끔 그 생각이 나면서 오빠를 만나면 또 해달라고 해야지, 했는데,,,,
끝내 그런 일은 다시 없었어요.
겨울이 깊어지자 어른들도 밖으로 안 나가게 되고, 도무지 오빠와 단 둘이 있을 기회가 안 생기는 거에요.
가끔 이불 속에 혼자 있을 때 내 손으로 오빠가 해주던 대로 해 보았지만
오빠가 해줄 때의 그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2월 달이 되자 오빠는 중학교에 간다고, 작은 보따리 하나 둘러메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니 학교에 다니려면 10여리 길을 나 혼자 다녀야 됐고, 점점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해 가을에 우리는 재산을 정리하여, 오빠가 중학교에 다니는 정선읍내로 이사를 하게되었어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
그게 자위행위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남자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여자는 꼭 그 남자한테 시집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 꼭 덕수 오빠한테 시집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죠.
밤에 이불 속에서 오빠를 생각하면서, 보지를 비비기도 하고,
탁구 공만해진 젖 가슴을 주물러도 보고 팓알만한 젖꼭지를 비틀기도 했어요.
온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빳빳해 졌다가 힘이 탁 풀리면서, 나른해 지고 나면, 혼자 이불 속에서 울고는 했어요.
오빠는 그 때 떠나고는 고향에 한 번도 오지 안 았어요.
방학 때면 혹시 왔나 하고 40여리 길을 4시간씩이나 걸어서 쑥골에 가보곤 했지만,
오빠의 그림자도 못보고 돌아서야 했어요.
싸리고개를 넘어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온 몸에 알이 밴 듯 쏙쏙 쑤시고, 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사나흘 생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연 이틀 그렇게 격열하게 씹을 해댔으니,,,,,,,
순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애들 기르는 가정주부가 맨날 밖으로 나돌 수도 없고,,,,,
겨우 두 번 보고 씹 한번 한 사이인데도, 이상하게도 자꾸 얼굴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지들은 자기를 강간한 남자한테 정든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거 한번 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눈 앞에서 얼굴이 어른거리는 데,,,,,,
이러면 안 된다고, 참고, 또 참아 봤지만, 일주가 지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순철씨와 나의 만남은 계속되게 되었어요.
신혼 때의 신랑 신부들이 그런 기분이었을 거 같아요.
우리 랑과 나 사이에는 사실 신혼 시절이란 게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 본격적인 연애(그 전에도 잘 아는 사이)기간만 해도 무려 4년이나 있었고,
결혼 후 두 달 만에 출산, 그리고 남편의 취직으로 인해 일년간 별거 등, 신혼 기분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순철씨를 만나고 나니,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있죠?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은 열이 오르고, 항상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게 아마 이런 걸 보고 사랑의 열병이라고 하는 걸 거에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랑이 내가 순철씨 하고 씹하고 온 날은 기막히게도 아는 거에요.
말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꼭 그 날만 씹을 하자고 하네요.
아니 내가 순철씨를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그날만 덤벼드는지?
나이도 한창 때고 둘이 모텔에 가면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격열하게 하자나요.
횟수도 두,세 번은 하게 되고 몸이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보지두덩도 좀 붓고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해도 좆물도 좀 남아 있고,
그런데 랑은 내 얼굴만 보면 아나 봐요.
순철씨하고 씹하고 온 날은 평소보다도 많이 흥분하여 대드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다른 사내하고 하루 종일 씹질을 해대고 와서는 막상 주인이 벌리라는데 안 벌릴 수는 없자나요.
보지는 쓰라리도록 아프고 다음 날이면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음날이면 전화통 앞에 앉아 이제나저제나 순철씨 전화나 기다리고 앉았으니,,,,,,
큰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막내는 이제 겨우 일학년인데, 엄마 손이 항상 필요한 시절이었는데,
엄마란 게 외간 남자한테 미쳐서 나돌아 다녔으니,,,,,,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확실히 미쳤던 거 같아요.
그렇게,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솔솔 부는 9월 중순 어느 날,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랑이 인터폰을 누르네요.
“빨리 나와 봐”
“왜 그러는데?”
“그냥 나와 봐”
우리 집 대문 앞에 번쩍거리는 쏘나타가 서 있는 거에요.
랑이 회사 일로 차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자가용을 산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있는 골목이 삼,사십여 호 되는데 자가용은 다섯 대도 안됐거든요.
더구나 번쩍거리는 쏘나타라니,,,,,,
“그 동안 제대로 쉬어 보지도 못하고, 여름 휴가도 못 갔는데,
우리 10월 초에 연휴도 있으니 고향에나 다녀오자”
나는 마음이 들떠서 열흘도 더 남았건만, 그 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빈 손으로 고향 떠나, 12년 만에 번쩍거리는 자가용 타고 고향 가는데
마음이 안 들떴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9월말일 토요일이었어요.
구월동에 살고 있던 언니네 오라고 해서 아이들 부탁하고,,,,,
영동고속도로에 접어들었는데, 당시의 영동고속도로는 2차선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부지런히 간다고 했는데, 정선읍내에 도착하니, 벌써 날이 어둑하네요.
읍내에서도 비포장도로로 한 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데,
날도 어둡고, 배도 고프니, 읍내서 자고 고향에는 아침에 들어 가 자네요.
하기는 고향에 가 봐야, 시6촌 내외가 살고 있을 뿐,
친정은 내가, 11살 때 읍내로 이사했다가, 내가 시집오던 해에 춘천으로 이사했어요.
시댁은 내가 결혼하던 해에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영월에서 고추농사 짓는 큰 딸네 집에 가 계셨거든요.
반주 한 잔 곁들여 저녁 먹고 여관방 잡아 들어가니 벌써 9시,
랑이 맥주나 한잔씩 더 하자네요.
아,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길 하려나?
둘이 술 마시자고 하면 할 얘기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요.
내가 워낙 지은 죄가 많은 지라, 랑 눈치나 볼 수 밖에요.
둘이 같이 샤워하고, 벌거벗은 채로 맥주 한잔하니 뱃속까지 시원해 지는 게 좋기는 한데,,
랑이 무슨 말을 할지 뻔한데 가슴은 콩당거리고,,,,,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토라지지 말고,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으니, 그런 거자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구.”
이런 땐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좀 유리하자요.
토라진 표정으로 먼저 선수를 쳤더니,,,
“그게 아니고, 다 좋은데 요즘 당신은 너무 들떠있어, 지금 당신은 애들 엄마고, 내 아내라는 사실까지 잊고 있는 게 문제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자나. 우선 나와 당신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변함 없이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바람 피는 사람은 남들보다 두 배 부지런해야 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야 내가 다 이해한다지만, 그 사람의 와이프도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 자나.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하고 그러고 다니면 언제 돈 벌어 가족 부양하고.”
“우리사회가 아직은 바람 피는 여자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아.
언제 동네에 소문 날지 모르는데 항상 조심하고 좀 자제해! 두 번 만날 거 한번으로 줄인다하고,,,,,”
“미안 앞으로는 당신 말 잘 들을께”
맞아요.
어떻게 이룬 가정인데,,,,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단란한 내 가정을 깰 수는 없자 나요.
그렇다고 순철씨를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순철씨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도 쑥골에 도착해 보니, 벌써 9시가 넘었네요.
길이 워낙 험해서 한 시간 예정으로 출발했는데 두 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구경에 빠지기도 했고,
랑이 새 차로 비포장길을 가게 되니 많이 조심을 했나 봐요.
6촌 형님 댁 마당에 차를 세우고 보니, 형님 내외분은 산 비탈 밭일을 하시더라고요.
랑이 큰 소리로
“형님! 나 덕수 왔어요!”
허둥지둥 달려 내려 와 흙 묻은 손으로 우리 두 손을 꼭 잡으시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리네요.]
울 남편 두메 산골에서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향 떠나 아르바이트하며 대학까지 마치고,
스물넷에 고향에서 결혼식 올리고는 바로 취직한다고
고향 떠난지 12년만에 서른여섯 중년에 자가용 몰고 고향 찾았는데,,,,
넷이 서로 얼싸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형님 내외분은 닭이라도 한 마리 잡는다고 부산을 떨고, 우리는 동네나 한 바퀴 둘러보겠다고 나섰어요.
전에 살던 옛집 찾아가니, 다 쓸어지고, 형체만 남았는데 마당에는 잡초가 허벅지까지 차 오르더군요.
우리 랑이랑 나랑 어려서부터 여기서 같이 자랐어요.
집도 담을 같이 대고 붙어 있는 이웃이었지요.
마당 앞에는 장정 여나믄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큰 너럭바위가 있고,
그 앞으로 폭이 2,3미터쯤 되는 개울이 흐르는데, 집은 다 무너졌어도,
너럭바위와 흐르는 개울물은 여전하더라고요.
나와 랑의 모든 추억이 바로 이 너럭바위와 개울에서 시작된 것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우리는 10여리 밖에 있는 분교에 다녔는데, 쑥골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늘 둘이 같이 다녔어요.
학교에 다녀 와서도 같이 놀 또래라고는 둘 밖에 더 있었겠어요.
형제들은 두 집 다 많은 편이었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돈 벌러 나간다고, 도회지로 가고,
우리 오빠도 중학생이 되어 정선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되어,
같이 놀 또래라고는 달랑 둘이 전부였거든요.
냇가에서 고기도 같이 잡고, 여름이면 너럭바위에 둘러앉은 동네 어른들 틈에 끼어 옛날얘기도 듣고,
도깨비 얘기라도 듣는 날은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던 기억까지,,,,
그냥 같이 그렇게 뛰놀며,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우리 랑과 나는 결혼까지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내가 11살 때, 그러니까 랑이 육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요.
동네 사는 언니가 정선읍내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어른들은 모두 읍내에 나가고 동네에는 달랑 우리 둘이 남게 되었죠.
랑네 집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이 형편이 좋아서, 방도 좀 깨끗했고 따듯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우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시골집이라 방바닥은 뜨거운데도 머리 쪽은 찬바람이 휘휘 거리는 거에요.
둘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놀다 잠이 들었었나 봐요.
기분이 이상해서 깨 보니 랑(지금부터는 오빠라고 쓸게요)이
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이제 밤톨만큼 부풀은 내 젖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거에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응 그냥 좀 있어 봐”
난 정말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뭔가 잘 못하는 거 같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얼굴에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쿵당 거리고, 아무튼 싫지는 않았어요.
살짝 눈을 뜨고 오빠를 보니, 오빠도 얼굴이 벌개져 있더군요.
오빠가 내 바지를 끌어 내리고, 내 보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손 끝으로 살짝 살짝 만져주더군요.
찔끔찔끔 오줌을 지리는 것 같은데, 오줌을 싸는 것은 아니고, 온 몸이 짜릿짜릿해 지는데,,
나는 그냥 숨만 쌔근거릴 수 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네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오빠가 더 참을 수가 없었던지 바지를 훌떡 벗고 자지를 꺼내 놓고 나보러 만져 달래요..
개울에서 같이 고기도 잡고 멱도 감고 할 때, 오빠 자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에 보던 거 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빳빳하게 섰는데 색깔도 더 붉어 진 거 같고, 하도 이상해서 “오빠 왜 그래?” 하면서 손으로 잡아 봤어요.
오빠의 얼굴 표정이 확 변하면서,
“응, 그래 ,그렇게, 좀 더 좀 더,”
오빠가 시키는 대로, 몇 번 더 만졌더니, 내 얼굴 쪽으로 오줌을 확 싸 버리는 거에요.
“에이, 오빠 나한테 오줌 싸면 어떻게 해,”
얼른 닦아 내려고 하는데 끈적끈적하는 게, 색갈도 틀리고 냄새도 좀 나고, 이상하더라고요.
오빠가 얼른 부엌에 가서 행주를 가져다 내 얼굴과 손에 묻은 걸 깨끗이 닦아주데요.
“순아야!, 너 오늘 있었던 일 어른들에게 말하면 안돼!”
“응, 알았어”
사실 나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결코 어른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 가끔 그 생각이 나면서 오빠를 만나면 또 해달라고 해야지, 했는데,,,,
끝내 그런 일은 다시 없었어요.
겨울이 깊어지자 어른들도 밖으로 안 나가게 되고, 도무지 오빠와 단 둘이 있을 기회가 안 생기는 거에요.
가끔 이불 속에 혼자 있을 때 내 손으로 오빠가 해주던 대로 해 보았지만
오빠가 해줄 때의 그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2월 달이 되자 오빠는 중학교에 간다고, 작은 보따리 하나 둘러메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니 학교에 다니려면 10여리 길을 나 혼자 다녀야 됐고, 점점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해 가을에 우리는 재산을 정리하여, 오빠가 중학교에 다니는 정선읍내로 이사를 하게되었어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
그게 자위행위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남자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여자는 꼭 그 남자한테 시집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 꼭 덕수 오빠한테 시집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죠.
밤에 이불 속에서 오빠를 생각하면서, 보지를 비비기도 하고,
탁구 공만해진 젖 가슴을 주물러도 보고 팓알만한 젖꼭지를 비틀기도 했어요.
온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빳빳해 졌다가 힘이 탁 풀리면서, 나른해 지고 나면, 혼자 이불 속에서 울고는 했어요.
오빠는 그 때 떠나고는 고향에 한 번도 오지 안 았어요.
방학 때면 혹시 왔나 하고 40여리 길을 4시간씩이나 걸어서 쑥골에 가보곤 했지만,
오빠의 그림자도 못보고 돌아서야 했어요.
싸리고개를 넘어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